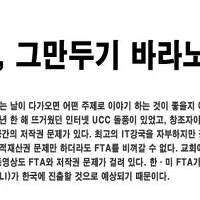魂이 없는 명품도시엔 시민도 없다

'신은 천국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발명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945년 해방 무렵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2.9%였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80%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 1949년까지 전체 국민의 82.8%가 농촌에 거주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반대로 그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한다. 이는 달리 말해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시민이며, 우리 사회에 가장 일반화된 정주 형태가 도시 속의 삶을 의미한다는 걸 뜻한다. 그러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꿈꾸는 것은 인간이 천국을 꿈꾸는 것 만큼이나 당연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개발 사업 혹은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인천광역시 역시 명품도시의 꿈에 부풀어 있다. 수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치, 문화, 경제 블랙홀에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은 그간 중앙의 과도한 자원 독점에 따른 과소개발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었다. 최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한 서울이 한계에 직면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지역에서 개발 열기가 들끓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개발 열기의 실상을 짚어보면 부동산 택지개발을 통한 전 지역의 강남화라는 병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천광역시가 공공연히 표방하는 명품도시론의 주된 내용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구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역적으로 변형·축소한 '부자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51층 쌍둥이 빌딩을 건설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 역시 인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상징성보다는 또 하나의 타워팰리스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인천만의 고유한 랜드마크가 되기엔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에서도 이미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가옥 구조가 획일적으로 바뀐 것처럼, 초고층빌딩 역시 명품도시 인천의 상징이 되기엔 문화적 기초가 너무나 허약해 보인다.
잘 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잘 살게 되고,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주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을 비롯한 대개의 지자체가 선택한 길은 불행히도 부동산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잘 사는 도시 만들기에 편중되어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인근의 도시들을 거닐다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나 부동산 개발 열기에 들뜬 시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하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서울 강남·북 간의 개발 격차가 불러온 시민들의 열패감이 지역 시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파된 결과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새롭게 개발된 도시, 품격 높은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진 도시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명품도시 인천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함께 논의해 본 바도 거의 없다. 조감도 속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모습, 시청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낸 홍보동영상 속의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문화가 없고, 철학이 없고, 시민이 없는 개발 프로젝트의 열기 속에 혹시 과거 어느 날엔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밀려나고 '떴다방'들만 득시글대는 짝퉁 시민들이 횡행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 명품엔 만드는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들 하는데, 새롭게 건설하는 명품도시에 깃들 혼은 무엇일지가 궁금해진다. 아니, 그 같은 장인의 손길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을 명품으로 결정해주는 것은 장인이 아니라 언제나 시민의 몫이란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 2007년 02월 16일 (금) 경인일보 >

'신은 천국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발명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945년 해방 무렵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2.9%였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80%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 1949년까지 전체 국민의 82.8%가 농촌에 거주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반대로 그 정도 비율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한다. 이는 달리 말해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시민이며, 우리 사회에 가장 일반화된 정주 형태가 도시 속의 삶을 의미한다는 걸 뜻한다. 그러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꿈꾸는 것은 인간이 천국을 꿈꾸는 것 만큼이나 당연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개발 사업 혹은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인천광역시 역시 명품도시의 꿈에 부풀어 있다. 수도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치, 문화, 경제 블랙홀에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은 그간 중앙의 과도한 자원 독점에 따른 과소개발이라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었다. 최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한 서울이 한계에 직면하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지역에서 개발 열기가 들끓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개발 열기의 실상을 짚어보면 부동산 택지개발을 통한 전 지역의 강남화라는 병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천광역시가 공공연히 표방하는 명품도시론의 주된 내용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구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역적으로 변형·축소한 '부자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51층 쌍둥이 빌딩을 건설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 역시 인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상징성보다는 또 하나의 타워팰리스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인천만의 고유한 랜드마크가 되기엔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에서도 이미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가옥 구조가 획일적으로 바뀐 것처럼, 초고층빌딩 역시 명품도시 인천의 상징이 되기엔 문화적 기초가 너무나 허약해 보인다.
잘 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잘 살게 되고,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주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을 비롯한 대개의 지자체가 선택한 길은 불행히도 부동산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잘 사는 도시 만들기에 편중되어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인근의 도시들을 거닐다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나 부동산 개발 열기에 들뜬 시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하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서울 강남·북 간의 개발 격차가 불러온 시민들의 열패감이 지역 시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파된 결과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새롭게 개발된 도시, 품격 높은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진 도시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명품도시 인천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함께 논의해 본 바도 거의 없다. 조감도 속에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모습, 시청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낸 홍보동영상 속의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문화가 없고, 철학이 없고, 시민이 없는 개발 프로젝트의 열기 속에 혹시 과거 어느 날엔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밀려나고 '떴다방'들만 득시글대는 짝퉁 시민들이 횡행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 명품엔 만드는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들 하는데, 새롭게 건설하는 명품도시에 깃들 혼은 무엇일지가 궁금해진다. 아니, 그 같은 장인의 손길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을 명품으로 결정해주는 것은 장인이 아니라 언제나 시민의 몫이란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 2007년 02월 16일 (금) 경인일보 >
'LITERACY >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평 얼짱 윤주현을 아십니까? - 2007년 04월 13일자 <경인일보> (0) | 2010.11.12 |
|---|---|
| 재현된 전쟁의 표면과 재구성해야 할 전쟁의 진실 (0) | 2010.11.07 |
| 뉴미디어 시대의 청소년문학- 오늘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읽는가(계간 <청소년문학>, 2006년 가을호) (0) | 2010.11.05 |
| 포토저널리스트 로버트 카파의 삶과 작품세계 - <시네21>. No. 597호 (0) | 2010.11.04 |
| 한미FTA, 그만두기 바라노라 - 2007년 03월 16일자 <경인일보> (0) | 2010.11.02 |
| 이 모든 무수(無數)한 반동(反動)이 좋다 - 계간 『황해문화』, 2007년 봄호(통권 54호) 권두언 (0) | 2010.10.30 |
| 바람구두가 선정한 2006년의 책 - 월간 <함께사는길>, 2006. 12월(통권162호) (0) | 2010.10.30 |
| 2005년의 책과 사건 5 - 월간 <함께 사는 길>, 2005년 12월호(통권 150호) (0) | 2010.10.30 |
| 판도라의 호기심을 통해 발견한 희망, 금서(禁書) (0) | 2010.10.29 |
|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기획, 네오콘 프로젝트 (0) | 201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