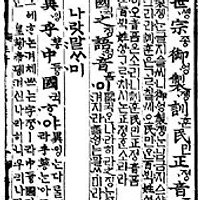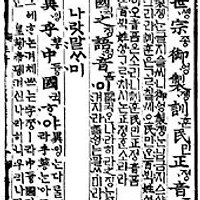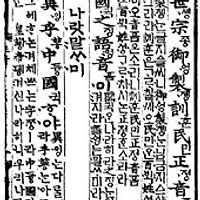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논어(論語)』 - 학이(學而)편

걸음마가 일종의 본능에 해당한다면 자전거 타는 것은 본능이 아니므로 배우는 과정에서 걸음마와 같은 난이도를 가졌지만 공부와 가장 흡사해 보인다. 몇 차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야만 균형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자전거를 한 번 배운 사람은 잘 타고 못 타고의 차이야 있겠지만 세월이 가도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다. 자기 몸에 자전거 타기가 온전히 익은 탓이다. 습(習)이란 흰 새가 날갯짓하는 것을 본 따 만들어진 말이다. 공부란 그저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서 온전한 내 것을 만든다는 말이니 감히 논어를 공부한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공자는 자장(子張)편에서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이라 하여 “수시로 익혀 날마다 모르는 것을 날마다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달마다 그 할 수 있는 바를 잊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배운 것이 몸에 익어 완전히 내 것이 된다고 했다.
『논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약간만 검색 해봐도 숱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도 상당수는 결국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다. 원래 공부를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술이부작(述而不作)’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내 경우엔 앞으로도 그 경지에 이를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까닭은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일 뿐이다.
『논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대부분 공자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논어』는 공자의 죽음 직후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00여년이 흐른 뒤에 엮인 것들이다. 따라서 책에 수록된 내용 중 정말 공자가 한 말이 맞는가 여부를 놓고 현재까지도 논쟁이 빚어지는 말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런 점은 『성서』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공자를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종교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자의 생존 당시는 물론 그의 사후 현재까지도 인간세계에서 주술적 세계관(혹은 광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공자는 고도의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본위의 이성적 세계관을 확립한 인물로서 이후 우리가 유학(유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더욱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주의자였다고 생각한다.
『논어』에 각각의 편들은 해당 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따서 붙인 것이다. 『논어』의 구분을 이루는 각각의 편(編)들은 사실 체계적인 것이 아니므로 『논어』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으나 처음 『논어』를 엮을 시기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점을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내가 이보다 나은 독서법을 알 수 없으리라 생각해 일단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까닭으로 『논어』에는 앞과 뒤의 이야기가 다르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어』에 대해 주석을 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또 한 가지 미리 밝혀둘 만한 것은 『논어』를 비롯한 사서(四書)에 주석을 단다는 것은 유교 질서가 지배한 동아시아에서는 사상가로서 입론(立論)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고려 시대 한반도에 유학이 전해진 이래 지금까지 이것을 실천에 옮겼던 이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뿐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13경에 주해를 단다고 하니 그로서는 동양학 전공자로서 필생의 업적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學而時習之, 不亦說乎”가 『논어』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혼자 생각하기에 이 문구가 가장 첫 머리에 온 까닭은 이 말들이 공자의 일생과 목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習)이 배움의 실천적인 태도와 상태를 의미한다면, 학(學)이란 말은 단순히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읽었던 『대학(大學)』에 나오는 바로 그 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하니라.
큰 가르침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과 하나 되는 것에 있으며, 지극히 선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있다. <『대학』, 經一章>
공자는 뜻을 품었으나 그것을 정치에 직접 반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선 매우 불행한 인물이었다. 공자는 덕이 높았으나 그의 생전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3년간 방랑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한 좌절감뿐이었다. 제자 키우는 것을 군자의 삼락(三樂) 중 하나로 높이 평가했으나 학문적 계승자였던 안회(安回)를 잃고, 예수에게 베드로라 할 수 있는 자로(子路)마저 앞세워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학문을 배우고 익혀 덕이 높아지면 외롭지 않다(德不孤 必有隣一)”<이인>이라 하였고, “학문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준다(以文會友 以友輔仁)<안연>”이라 했다. 이처럼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였지만 생전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노여워하고 비탄에 잠겼더라면 오늘날의 공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하여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배움은 나 자신을 완성하는데 뜻이 있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헌문>”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기르며 홀로 고독하게 자신의 학덕을 연마했다. 하지만 고향에서 후학을 얻어 기르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큰 길(大學之道)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군자는 세상의 도가 행하여져 학문이 인정받고 쓰여지게 되면 나아가 천하만민을 위해 배운 바를 다 펼칠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물러나 조용히 학문을 연마할 뿐이다.(用之則行 舍之則藏)<술이>, (邦有道則任 邦無道則可券而懷之)<위령공>” 그런 그였기에 멀리서 찾아오는 벗의 반가움이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으리라.
비록 『논어』의 첫 문장이 겉으로 보기엔 덤덤하게 군자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에는 공자가 평생을 두고 실천하며 살아온 일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LITERACY > 곱씹어 읽는 고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어(論語)-<학이(學而)편>11장. 其志其行 (0) | 2010.11.30 |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10장. 溫良恭儉讓鎰之 (0) | 2010.11.19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9장. 愼終追遠 (0) | 2010.11.12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8장. 無友不如己者 (0) | 2010.11.06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7장. 賢賢易色 (0) | 2010.10.30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6장. 行有餘力 則以學文 (0) | 2010.10.19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5장. 道千乘之國 (0) | 2010.10.15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4장. 吾日三省吾身 (0) | 2010.10.15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3장. 巧言令色 (0) | 2010.09.15 |
| 논어(論語)-<학이(學而)편>02장.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0) | 201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