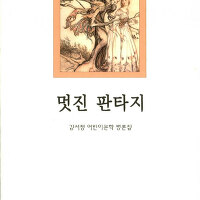떠돌이 개 - 가브리엘 벵상, 열린책들(2003)
김중식의 시집 <황금빛 모서리>에는 "식당에 딸린 방 한 칸" 이라는 다소 장황한 제목의 시 한 편이 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끝에 대해/ 끝까지 간 의지와 끝까지 간 삶과 그 삶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귀가할 때마다/ 하루 열여섯 시간의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육체와/ 동시 상영관 두군데를 죽치고 돌아온 내 피로의/ 끝을 보게된다 돈 한푼 없이 대낮에 귀가할때면/ 큰길이 뚫려 있어도 사방이 막다른 골목이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 나는 정확하게 20년간 헤어져 살던 어머니와 처음 대면했다. 그 이전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3살 때,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의 기억 속에 단 두 번 그렇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따라 천호동 423번지로 들어갔다. 1층에서는 창녀들이 붉은 등을 밝혀놓은 쇼윈도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2층의 닥지닥지 붙은 벌집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정액을 온몸으로 끌어내는 일을 했다. 나는 그 윗층에 살았다. 423번지 골목을 따라 내가 사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불과 20여 미터였지만, 그 20여 미터를 걸어가는 일이 내게는 세상 더할 것 없이 굴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내 낯을 익히라고 권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팔에 안겨 왔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나이 23살의 여름이 그렇게 사창가 3층 옥탑방에서 저물어 갈 줄은 몰랐다. 김중식은 "옐로우 하우스 33호 붉은 벽돌 건물이 바로 집 안인데/ 거기보다도 우리집이 더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로 들어가는 사내들보다 우리집으로 들어가는 사내들이/ 더 허기져 보이고 거기에 진열된 여자들보다 우리 집의/ 여자들이 더 지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난 그 기분을 알듯 모를 듯 하다. 나는 그들보다 허기져 보이지 않았고, 우리 집 여자들이 그들보다 더 지쳐 보이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나는 차라리 더 견딜만 했을 것이다. 우리 집에 한 명 뿐인 남자가 되어버린 나는 어느 순간, 어머니에게 매일 용돈을 타 가는 사내가 되었고, 나는 기생 품에 안긴 이상처럼 그렇게 매일 얼마간의 돈을 타서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서는 이 세상 더할 수 없는 고결한 시인들의 시를 배웠고, 작가 세계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나의 하교길은 사창가로 향했다.
우리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상의 끝에 있는 집, 내가 무수히 떠났으되 결국은 돌아오게 된, 눈물겨운. 내게 현실은 늘 너무나 구체적인 진실이었다. 나는 사창가에 살고 있는 18살짜리 여자 애를 알았고,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두 번이나 애를 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더이상 기둥 서방 오래비들이 포진해 있지 않았고, 기둥서방 아저씨들이 외곽 경비를 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곳을 지키는 남자들의 연령은 그대로인데 그곳의 상품인 여자 아이들의 꽃은 아직 채 영글기 전에 팔려야 했다. 아니, 그래야 팔릴 수 있었다. 내게 세상은 상상할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었다. 똑바로 서서 뛰어다니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의 널찍한 등판을 기대보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벌집 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으며 나는 밤새 수음을 했다.
밤의 세상과 낮의 세상 사이에서....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밖에 없었다. 모든 스무살 짜리 남자는 20년이 흐른 뒤엔 40살의 남자가 된다. 스무살의 남자는 분명 마흔살의 남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스무살의 남자는 선인을 알고, 악인을 미워할 줄 안다. 진실의 언어와 가식의 언어를 구분하는 법도 알고 있다. 스무살의 남자는 지미 헨드릭스도, 짐 모리슨도, 제니스 조플린도 알지만 마흔살의 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더이상 순수하다고 할 수 없는 마흔 살의 남자는 스무살의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군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자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히도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자 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다. 나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일이 여전히 편하다. 가브리엘 벵상 (Gabrielle Vincent)의 일러스트로 꾸며진 한 권의 책이 여기 있다. 동화책이라고 해야할까? 글쎄, 만약 버림받는 공포를 되새기고 싶은 자학증세가 있는 어린이가 아니라면 이 책을 즐거워하며 보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 말 안들으면 이렇게 버릴테다. 하고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이 책은 동화책이라기 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인간이 가장 처음 버림받은 경험을 하는 것은 언제일까? 아마 그 때는 어미의 자궁으로부터 억지로 밀려나와 탯줄이 끊기는 순간이 아닐까?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 버림받는 경험은 그토록 원초적인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공녀, 소공자"와 같은 동화를 고전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읽도록 한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와 달리 현실 속의 우리들이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므로 우리들은 소공자, 소공녀를 통해 돈많고, 자상한 보호자를 상상한다. 부모에게 버림받이본 경험이 있는 자식의 상상력이란 늘 그렇게 음울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따스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부재하는 상상력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토록 완전하게 주변과 단절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때로 어머니가 없는 아파트 현관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경험은 그토록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경험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브리엘 뱅상은 이 책에서 글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버림받은 기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작가는 그림 속에서 색채를 제거한다. 우리는 단조로운 모노톤의 세계에 펼쳐진 막막함, 대책없는 기분을 절감한다. 그는 이 막막함과 대책없음을 구질구질하게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는 최대한 냉정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낸다. 크로키처럼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그려낸 듯 그림이지만 그 안엔 냉혹할 정도로 섬세한 관찰이 들어 있다. 첫 장을 펼쳐보면 차창 밖으로 던져진 개가 등장한다. 죽어라 달려보지만 자동차는 어느새 저만큼 영화 속 롱테이크(Long take)의 한 장면처럼 멀어져 간다. 힘을 다해 달려가보지만 지친 개는 이윽고 멈춰설 수밖에 없다. 꼬랑지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채 잔뜩 움츠린 표정의 개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연상해보는 일이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게 단절된 속에서도 불가사리 새살 돋듯 새로운 인연을 시작한다. 비록 버림받은 인간이라도 영원히 버림받는 법은 없다. 삶이 지속되는 동안 인간은 누구라도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버림 받아본 짐승들이 그러하듯 버림 받아본 인간 역시 마음을 모두 내어주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
'REVIEW > 어린이/청소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터의 의자 - 에즈라 잭 키츠 | 이진영 옮김 | 시공주니어(1996) (0) | 2011.01.24 |
|---|---|
| 내 친구 루이 - 에즈라 잭 키츠 | 정성원 옮김 | 비룡소(2001) (0) | 2011.01.11 |
| 그림책 쓰는 법 - 엘렌 E. M. 로버츠 (지은이) | 김정 (옮긴이) | 문학동네어린이(2002) (0) | 2010.12.27 |
| 막스와 모리츠 - 빌헬름 부쉬 지음, 곰발바닥 옮김 / 한길사 / 2001년 7월 (0) | 2010.12.13 |
| 멋진 판타지 - 김서정, 굴렁쇠(2002) (0) | 2010.12.02 |
| 무쇠인간 | 테드 휴즈 지음 | 서애경 옮김 | 비룡소(2003) (4) | 2010.11.08 |
| 레이먼드 브릭스 - 바람이 불 때에 | 시공주니어(1999) (0) | 2010.11.05 |
| 안나 피엔버그 -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 (0) | 2010.09.15 |
| 필리파 피어스 - 아주 작은 개 치키티토 (0) | 2010.09.14 |
| 프랑수아 플라스 - 마지막 거인/ 디자인하우스/ 2002 (0) | 2010.09.13 |